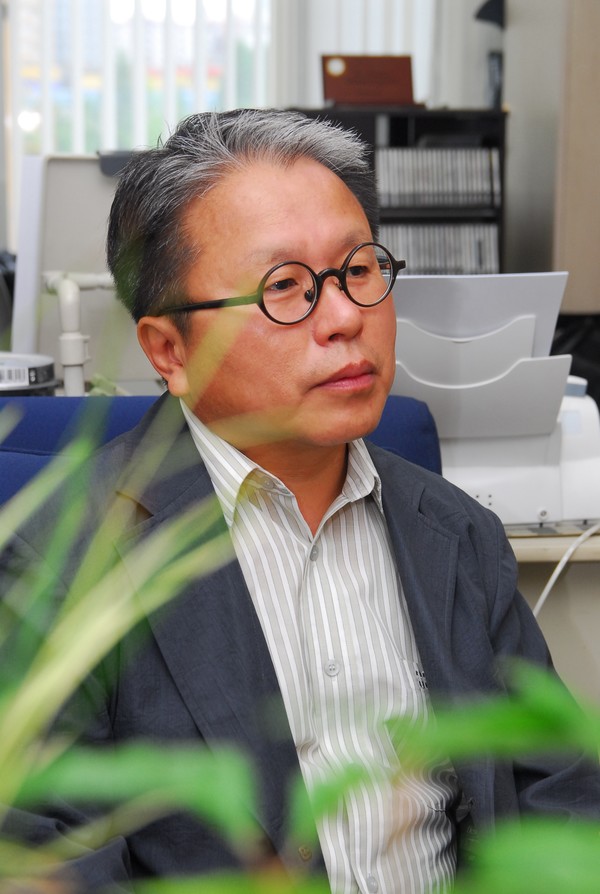
‘나무를 심는 것은 꿈을 심는 일이다’. 꿈을 심고 가꾸는 일을 어릴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곁은 바른 꿈으로 가득한 이웃으로 채워질 것이다. 나무와 숲을 다루는 공부를 해 오면서, 또 캠퍼스에 나무를 심고 숲을 키워 오면서 이 일은 긴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다듬어가야만 하는 일이라고 줄곧 생각해 왔다. 나무 자람이, 숲 머리, 숲 가슴 커짐이 그렇듯이 바쁘게 만들고 만족하는 그런 일은 결코 아닐 것으로 여겨왔다.
캠퍼스에 나무를 심으면서 어떤 나무가 우리 캠퍼스 숲에 어울리며, 그런 나무들이 어우러진 숲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며, 그 숲 안팎은 어떤 가르침과 배움의 터로 변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나에게는 나무를 심는 출발선에서부터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명제였다. 때때로 주변의 공원, 만든 숲에서 만나는 모습은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나무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캠퍼스의 바른 숲 모습은, 자연 숲에서 보듯이 여러 작은 나무들이 서로 자라면서 그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간 채움 습성이 조화롭게 전개되어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서 햇빛과 물, 땅속과 밖을 먼저 차지하겠다는 싸움이 있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답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안팎에서 바라보고, 거닐고, 앉아 쉬면서 만나야 하는 우리 마음도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렇게 닮아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캠퍼스에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통하여 내가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중함은 ‘나무의 자람과 숲의 커짐을 보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변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속 모습이 자기의 가슴과 세상의 커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치와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우리 캠퍼스 숲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들을 심고 숲이 스스로 커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생각해봤다.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무와 숲은 우리 가까이에서 늘 접하는 나무들과 자연 숲 또 우리가 만든 숲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만든 숲들도 실은 우리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 캠퍼스 숲에 들어와야 하는 바람직한 나무는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적응해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고유의 나무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 새로운 품종의 멋스러움보다는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는 이런 나무들을 곁에 두어야 그 은은함으로, 거부감없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이런 생각에서 캠퍼스 숲에 심은 나무들이 소나무, 전나무, 쉬나무들이다. 또 하나 편백인데, 지난 15년 동안 예술디자인대학 뒷 숲에 해마다 봄에 학생들과 100~150그루씩 심어 지금은 작은 숲, 숲길이 됐다.
이 편백 숲을 만드는 묘목들은 내가 학생들과 용기에 씨앗을 뿌려 학교 온실에서 3~4년 동안 키워온 것들인데 자신들이 씨앗을 뿌리고 키워 자신들이 또 물려받은 후배들이 심은 나무들이다. 지금은 많이 자라 작은 숲으로 변해 있다. 내가 캠퍼스에 편백 숲을 만드는 이유는 편백 숲이 가지고 있는 치유와 회복 즉, 힐링의 능력이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미래를 꿈꾸다가 가끔 지쳐 쉬고 싶을 때 찾아가서 몸과 마음을 그 숲에 내려놓고 그 숲길을 걸으면서 또 털썩 앉아서 머리를 들고 숲과 숲 하늘을 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그 하나였다. 편백은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와 숲이기에, 서울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수종이기에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캠퍼스에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 이 숲은 이웃 주민들도 함께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10년 전, ‘드림 건국 2011’에서 썼듯이 우리 캠퍼스의 나무와 숲, 그들을 이어주는 나뭇길과 숲길은 우리 캠퍼스의 마음과 몸을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물이다. 자연이 주는, 캠퍼스라는 고정되고 단절된 공간의 나무와 숲이 주는 아름다운 기쁨은 그렇게 쉽게 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만날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희열이 아니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볼 수 없는 신기루처럼, 자연의 아름다움도 한번 잃으면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고이 가슴에 품어야 할 희망이고 꿈이다. 지금 이 순간, 순간이 우리 캠퍼스의 나무와 숲이 주는 아름다움을 제대로 지키고 더 아름답게 키워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심고 돌봐왔다. 그 꿈길의 마지막 희열을 지금보다 더 푸른 나무와 숲이 제대로 어우러진 캠퍼스에서 만나면 안 될까? 나만의 소망일까? 보물은 잘 지키고 잘 간수할 때 보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