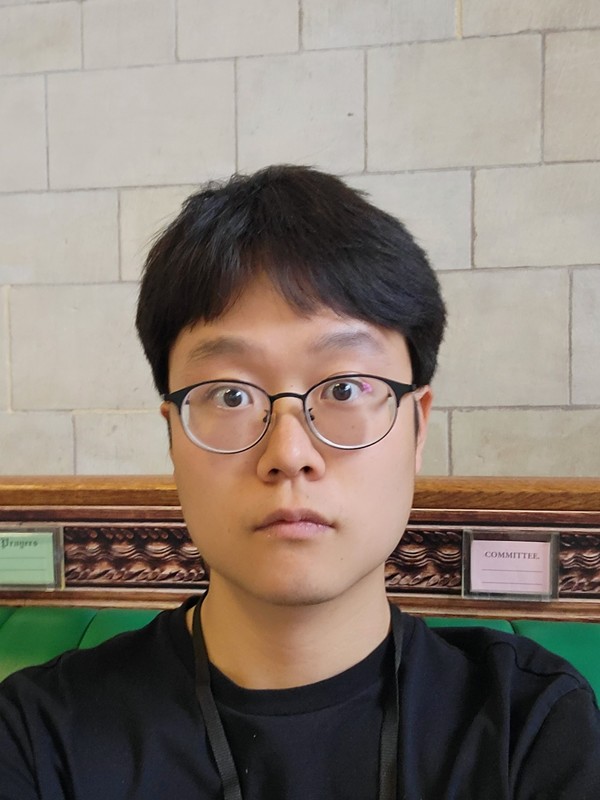
얼마 전에 만난 고등학교 때 친구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알기에 크게 기뻐할 일도, 슬퍼하거나 놀랄 일도 없다고 말한 친구는, 자기 삶이 남의 것보다 특별할 거라고 기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도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끈 저의 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라기보다는 이다지도 저를 못 살게 구는 세상에게 복수하고 싶은 억하심정에 차라리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의별 것에 다 마음을 쓰고 살았죠. 그러나 보일 때마다 주워서 제 안에 세운 이정표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길보다 이정표가 많아졌음을 눈치챘을 때의 당혹감이란.
지금 보내고 있는 8학기는 이상하게 시작부터 몸이 아팠습니다. 병이 나으면 병이 다시 오길 세 번. 사람으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11월 중순에 완전히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밥도 못 넘기는 상태인 저를 데리고 산책을 잠깐 나온 어머니와 앉아서 달을 보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미래도 과거도 나의 적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항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 잠을 잤습니다.
더 늦어져서 제가 무엇인가가 되어버리기 전에 이 시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때는 모든 것이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려는 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분명,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가지는 위대한 온기가 있다고 아직은 믿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더 천천히 가렵니다.

